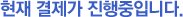TRAVELLER.
1
2
3




-

Traveller.
손바닥에서 이질적인 감각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펴 눈앞에 펼쳤다.
검은 구멍이 손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잠깐 동안 눈을 껌뻑거리며 구멍 속을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고요한 새벽에 잠이깨어 손바닥에 난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문은 당연한 감정이지.’라는 생각과
‘구멍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알 수 없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과거 언젠가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작은 연못이 있는 정원이 딸린 노란색 집. 작은 창문 안으로 유난히 새카맣고 긴 생머리의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흘러나오는 음률에 귀를 기울이며 그곳에 서 있던 그날.
하늘은 굉장히 푸르고 맑았다. 작은 새가 짹짹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공기는 약간 습했지만 젖은 흙냄새가 코를 찌르며 설렘을 가져왔다.
“첨벙-” 하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 보자 연못 위에 떠 있는 녹슨 철 범선 모형이 눈에 들어왔다.
물속에는 회색의 잉어들이 춤을 추듯 헤엄을 치고 있었고 물결이 생겨 범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손바닥에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는데 마치 격자무늬의 어떤 것을 만지는 촉감과 비슷하지만 꼭 그 렇지는 않았다.
때때로 그것은 금속의 차가운 질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고 물컹한 실리콘 느낌의 구체 같기도 했다.
스탠드의 불을 켜고 다시 한번 손바닥을 확인했지만 구멍은 없었다. 잠깐 동안 느껴졌던 불편한 기분도 어느새 사라져 있 었다.
가운을 입으며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복도의 냉기가 피부에 닿았고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있는 통로에서 다리 달린 잉어 가 쟁반을 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생명체는 209번, 210번, 211번. 일련의 번호판이 붙어 있는 방문들 앞을 능숙한 몸짓으로 지나치며 와인병을 하나 씩 놓고 갔다.
나는 와인병을 들고 통로를 지나 눈이 부시게 밝은 조명의 거실로 향했다.
곡면의 천창 밖으로 반짝거리는 별들이 박혀 있는 인디고 빛 하늘이 보였다. 순간 유성우가 쏟아져 강철 지붕을 후두둑 때 리는 소리가 들린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갔던 존재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소파에 몸을 기대어 누웠다.
와인병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거대한 새”
“톰 소령의 잔해”
“진흙으로 가득 찬 세상”
언젠가 들어 보았던 익숙한 음률과 함께 목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진다.
“다음 행선지 루트 308. 세 번째 행성”
그 순간 통창 밖으로 노란색 범선이 스쳐 지나갔다.
둥그런 여러 개의 창문 안으로 유난히 새카맣고 긴 생머리의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음률을 공기 중에 남긴 채 노란 범선은 조금씩 시야에서 사라져 갔다.
노란 범선의 허물이 떠다니는 것이 창밖으로 보였다.
나는 209번 방으로 돌아가 가운을 벗고 침대에 누우며 스탠드의 불을 껐다.
찰나의 순간 차갑고 단단한 혹은 뜨겁고 물컹한 그 어느 것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양가적이고 격정적인 감각이 소용돌이처 럼 한 번에 몰아닥쳤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나 자신이 붕괴되어 어딘가로 표류해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방의 천장, 푹신한 침대의 안락함, 와인의 취기가 나의 좌표를 확실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눈 을 감는다.
어느새 무수히 보이던 별들이 사라지고 유성우도 그 무엇도 없는 검은 암흑 속으로 녹슨 범선은 유유히 들어간다.
그 뒤로 녹슨 범선의 투명한 허물이 노란 범선의 허물과 함께 남겨져, 별들이 비추는 하늘을 떠돈다.
그리고 암흑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에서.
다시 한번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